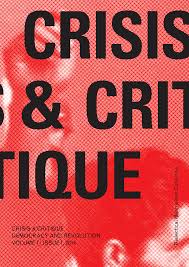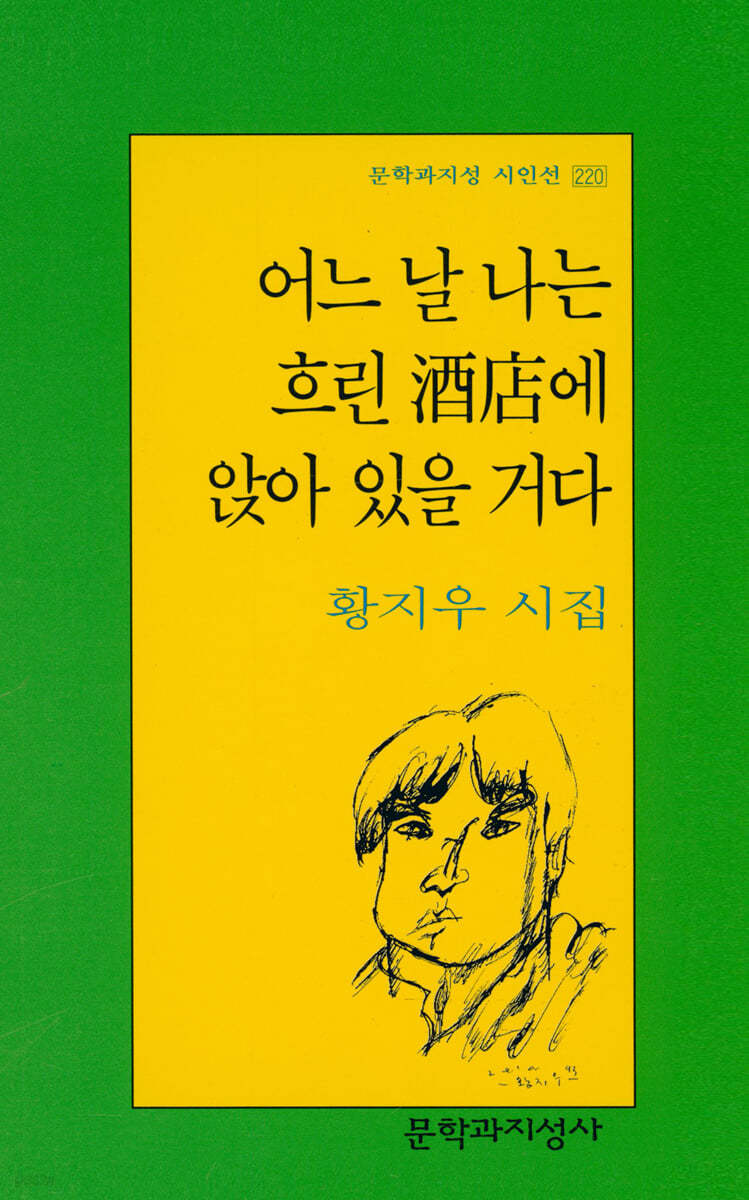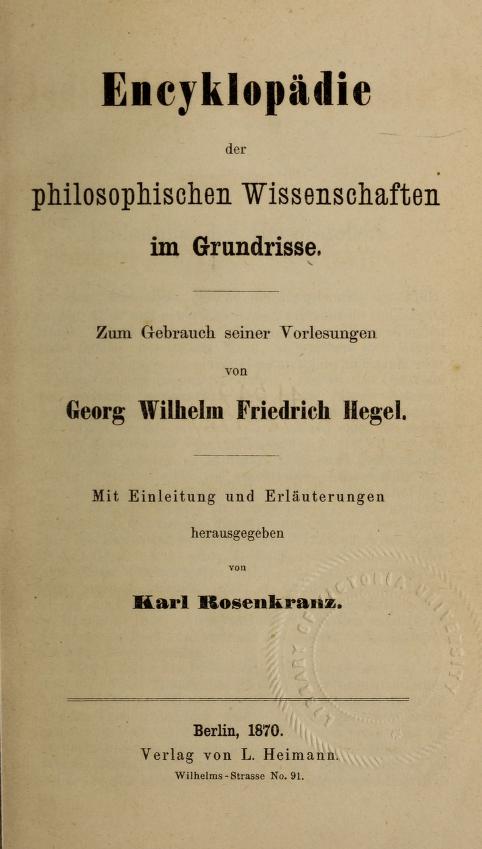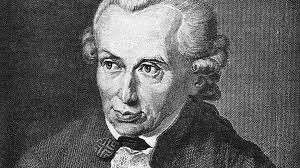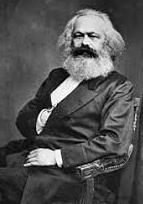"Entlassen. Remarks on Hegel, Sacrifice and Liberation", in Crisis & Critique, Jun., 2014 , pp.111-129. 예비작업 : 운명론에서 희생으로 [111] 이하 언급되는 내용은 내가 다른 곳에서 발전시킨 것, 즉 오늘날 숙명론을 옹호할 필요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옹호의 동기는 자유에 관한 문제적 이해理解를 분석하면서 획득되었고, 이러한 분석은 특히 데카르트, 칸트, 헤겔에 의해 정식화되었다. 이 저자들이 비판하는 자유에 대한 문제적 이해의 결정적인 특징은 자유를 능력capacity으로 믿는다는 것에서 구체화된다. 데카르트 및 다른 이들은 그러한 이해의 현상적 효과를 무관(심)한 상태state of indiffe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