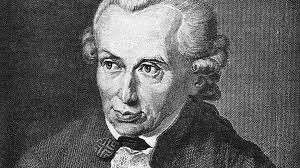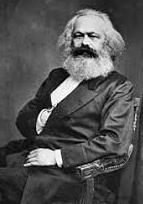4. 상품물신을 이해하는 데 추상이 그토록 중요한가?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는 상품물신을, 아니 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맑스는 의 출발점인 '상품'장이 자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임을 자인한 바 있는데, 사실 이 어려움의 많은 부분은 바로 추상과 관련된다.* 은 “부르주아 사회의 … 경제적 세포형태”(MEW23, 12, 김수행 1-상 4)인 상품의 의미를 묻는 데서 시작한다. 상품이란 무엇인가? 상품은 교환을 위한, 즉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다. 하지만 맑스는 이 뻔한 답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교환이 일반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은 “자명하고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 너무나도 이상한 것, 즉 “형이상학적 궤변과 신학적 잔소리로 가득찬 기묘한 물건”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