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 원문 번역>
일러두기 : 이하 번역된 24절의 추가 3의 두 번째 단락 헤겔은 철학이 맞닥뜨린 고유한 사태에 대한 종교적 표현이 '에덴에서의 추방'으로 표상됨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구약>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추방당하는 장면이 상징하는 바에 대한 헤겔의 런닝 코멘터리라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글이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유대-기독교의 원죄 관념을 활용하여 인간 사유의 출발과 해결과제를 설명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흥미를 끈다. 헤겔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인간 정신 및 사고가 자연과의 통일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스스로 사고한다는 것이 원죄가 되며, 심지어 사고능력이 인간에게 필연적인 만큼 원죄 역시 필연적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이 분열의 사고를 극복하는 것이 잃어버린 낙원의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헤겔은 이 분열의 사고가 인간이 지닌 신성神性이라고도 본다. 그렇게 원죄와 신성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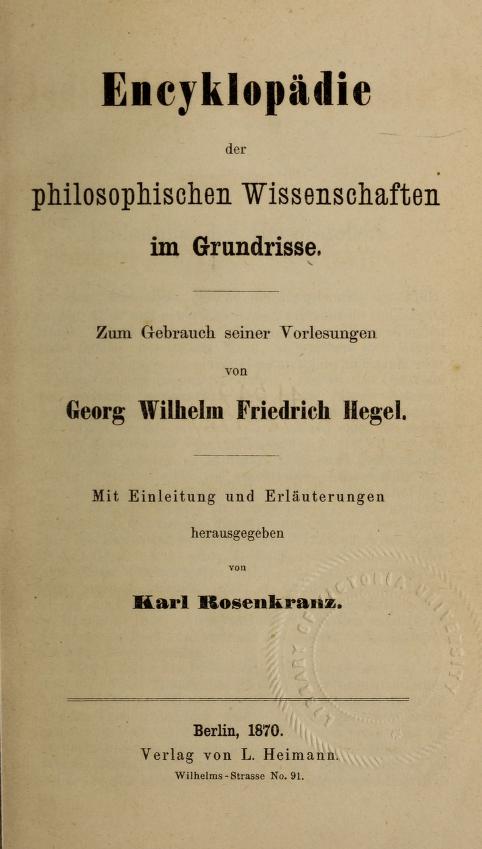
[86] 우리는 참된 것을 상이한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인식의 방식들은 단지 형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87] 당연히 우리는 경험을 통해 참된 것을 인식할 수도 있지만 이때 경험은 다만 한 가지 형식에 불과하다. 경험에서는 우리가 어떤 감각der Sinn*을 사용하여 현실에 접근하는지가 관건이다. 훌륭한 감각에서 훌륭한 경험이 생겨나며, 그러한 감각은 갖가지 현상의 유희 속에서 핵심을 알아본다. 이념은 저 너머에 혹은 [장막]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며 현전한다. 예를 들어 괴테의 경우처럼 자연과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훌륭한 감각은 훌륭한 경험을 만들어낸다. 곧 그러한 감각은 이성적인 것을 알아보고 표현한다. 나아가 이와는 달리 반성 속에서도 참된 것은 인식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사고된 것]가 맺는 상관관계das Verhältnis des Gedankens에서 참된 것이 규정된다. 그렇지만 즉자대자적으로 참된 것은 이 두 방식에서 아직 자신의 본래적 형식으로 현전하지 않는다. 사고의 순수 형식에서야 인식은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때 인간은 시종일관 자유로운 태도를 취한다. 철학 일반이 주장하는 바는, 사고의 형식이 절대적 형식이며 이 형식에서 진리가 즉자대자적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함은 일단 여타의 인식 형식들이 유한함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의 수준 높은 회의주의는 그러한 여타 형식들이 내적으로 모순을 지닌다는 것을 그 형식들 자체로부터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유한성을 입증한다. [하지만] 이 회의주의는 또한 이성의 형식들[을 다루는 일]에 착수할 때에[마저]도, 단지 유한한 것을 그들 탓으로 돌림으로써 그들을 유한성 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유한한 사고 형식들 전체는 [나중에] 논리적 전개 과정 안에서, 그것도 필연성에 따라 등장할 테지만 여기[“예비적 파악”]에서는 일단 비학문적 방식으로, 말하자면 소여 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형식들을 논리[학]적으로 다룰 때는 그들의 부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면도 드러날 것이다.
인식의 상이한 형식을 서로 비교할 때 최초의 형식인 직접적 앎直接知의 형식이 가장 적합하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차적인 것이라는 생각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이러한 형식에는 도덕적 견지에서 타락하지 않은Unschuld 모든 것, 나아가 종교적 감정, 다른 것에 구애받지 않는 신뢰, 사랑, 신의信義 그리고 자연적 신앙이 속한다. 다른 두 인식형식, 먼저 반성적 인식 형식과 다음으로 철학적 인식은 이 직접적인 자연적 통일에서 벗어나면서 등장한다. 이점은 이 두 형식 서로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사고를 통해 참된 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방식은 자신의 힘으로 참된 것을 인식하는 인간이 가진 자랑거리라는 생각에 쉽게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분열의 입장인 이러한 입장은 실로 모든 해악das Übel und Böse의 원천으로, 근원적 신성모독Frevel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88] 이에 따라 [저 통일로] 돌아가 속죄Versöhnung**하기 위해 사고와 인식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여기서 ‘자연적 통일에서 떠나버림’에 관해 말하자면, 이 즉자적으로 정신적인 것의 놀라운 분열은 아주 먼 옛날부터 다수 민족들[곧 유대-기독교 문화권]이 지닌 의식의 대상이었다. 자연에서 그러한 내적인 분열은 나타나지 않으며 자연적 사물은 어떤 악도 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의 타락Sündenfall에 관한 모세 시대 신화[유대-기독교의 구약]에서 이 분열의 원천과 귀결에 관한 오래된 표상을 얻는다. 이 신화의 내용은 [인간의] 본성적 사악함natürliche Sündhaftigkeit과 이를 벗어나기 위한 조력의 필요성에 관해 가르치는 본질적 교의敎義의 토대를 이룬다. 논리학의 관건은 인식이며, 이 신화에서도 인식과 인식의 근원 및 의미를 다룬다는 점에서, 인간의 타락에 관한 신화를 논리학 맨 앞에서 고찰하는 것은 적절한 일인 듯 보인다. 철학은 종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종교가 자신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지위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 이러한 신화나 종교적 서술이 말하자면 다 흘러간 소용없는 것이라고 하는 관점도 마찬가지로 거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수 민족들 사이에서 천년 동안 존경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제 인간의 타락에 관한 신화를 더 상세히 살펴본다면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듯, 인식과 정신적 삶의 보편적 상관관계가 표현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인간의] 정신적 삶은 직접적 상태에서 처음 나타날 때 타락하지 않았으며 다른 것에 구애받지 않고 [보편적 원리를] 신뢰한다. 하지만 정신의 본질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들어 있다. 정신적 삶은 즉자적인[=미발달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대자화[=자립적으로 발달한 상태] 됨으로써 자신을 자연적 삶, 더 구체적으로 동물적 삶으로부터 구별한다는 점에서 이 직접적 상태는 지양된다. 이러한 분열의 입장도 이후 마찬가지로 지양된다. 정신은 스스로 [자연과 정신의] 하나 됨Einigkeit을 복원한다. 그때 이 하나 됨은 정신적인 것이며, 저 복원의 원리는 사고 자체에 놓여 있다. 상처를 낸 사고가 상처를 또한 치유한다.
― 우리[서구]의 신화에 따르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이들은 곧 인간 일반이다―는 생명의 나무와 선악에 대한 앎의 나무[=선악과 나무; 이하 종종 ‘앎의 나무’로 지칭]가 서 있는 동산에 있었다. 인간이 앎의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금한다는 신의 말은 있었지만 생명의 나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앎을 얻지 못한 대신 타락하지 않은 상태로 머문다는 것이다. 다른 깊이 있는 의식을 지닌 민족들의 경우에도 인간의 최초 상태가 [89] 타락하지 않은 통일의 상태였다고 하는 표상이 나타난다. 이 점에서 드러나는 올바른 내용은, 분열[상태]가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지만 인간은 이 분열[상태]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멈춰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근거하여] 직접적이고 자연적인 통일이 옳은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그릇된 것이다. 정신은 한낱 직접적인 것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자신 안에 매개의 계기를 포함한다. 물론 타락하지 않은 아이[의 상태]에게는 마음을 끄는 감동적인 어떤 것이 있다. 하지만 이는 그와 같은 상태가, 정신을 통해 무엇이 산출되어야 하는지를 상기-내면화erinnern시켜 주는 한에서 그럴 뿐이다. 우리는 아이에게서 하나 됨을 직관하지만 이는 자연적 하나 됨이다. [하지만 본래적] 하나 됨은 정신의 노동과 도야를 통한 결과여야 한다―예수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다면...”[“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2-4)라는 말이 저 조건절에 이어진다.]와 같은 말을 했지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상태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 나아가 모세 시대의 신화에서 [인간이] 통일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는 외부의(곧 뱀의) 부추김에 의해 주어진다. 그렇지만 대립의 상태로 빠져드는 것은, 다시 말해 의식의 성장은 인간 자신에 내재적인 것이며, 이는 모든 개별 인간에게서 반복되는 역사이다. 뱀은 선악에 대한 앎에 신성神性을 집어넣는다. 실로 이 앎은 인간이 직접적 존재의 통일을 깨고 금단의 열매를 즐겼다는 사실로 인해 얻은 것이다. 깨어난 의식에 일어난 첫 번째 반성은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것은 매우 순박하지만 심오한 특징이다. 이 수치심에는 인간이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존재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이 분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동물에게는 수치심이 없다. 그렇게 볼 때 또한 의복의 정신적이고 윤리/인륜적인 원천은 ‘부끄러움’이라는 인간적 감정에서 찾을 수 있으며, 반면 순전한 물리적 필요성은 말하자면 이차적인 것이다.
― 이제 신이 인간에게 내린 소위 저주가 뒤따른다. 그 저주의 초점은 무엇보다 인간과 자연의 대립에 관련되어 있다. 남자는 이마에 땀 흘려가며 일해야 하고 여자는 고통스러운 출산을 겪어야 한다.[창 3:16-19] 여기서 노동에 관해 좀 더 말하자면 이 노동은 분열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분열의 극복이기도 하다. 동물은 필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직접적으로 발견한다. 반면 인간이 관계하는 자신의 필요욕구의 충족수단은 자신이 생산하고 형성한 것Hervorgebrachten und Gebildeten이다. 인간은 또한 그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적으로 관계한다.
― 신화는 아직 ‘낙원으로부터 추방’으로 끝을 맺지 않는다. “신께서 이르되, 보라, 아담은 [90] 선악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므로 우리 중의 하나같이wie unsereiner 되었다.”(창 3: 22)라는 또 다른 내용을 전한다 ― 인식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했던 앞에서와 달리 여기서 인식은 신적인 것으로 지칭되며, 여기에는 또한 철학이 유한한 정신die Endlichkeit des Geistes의 것일 뿐이라는 속설에 대한 논박도 들어있는 바, 철학은 인식이며, 인식을 통해 비로소 신과 같은 형상Ebenbild이라는 인간의 본래적 소명이 실현된다.
― 이에 덧붙여, 신이 인간을 에덴동산에서 쫓아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였다고 전할 때[인용된 앞 성경구절에 곧바로 이어서, “...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창, 3;22-23)라고 나온다], 인간은 자연적 면에서 보면 실로 유한하고 필사必死의 존재이지만 인식에 있어서는 무한함이 표명되고 있다.
인간은 본성상 악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교회의 가르침이며, 이와 같은 본성상 악함을 원죄Erbsünde라고 부른다. 그러나 여기서 원죄가 단지 최초의 인간의 우발적인 행동에 근거한다는 피상적 표상은 버려야 한다. 정신의 개념에는 [인간이] 행한 일에서*** 그가 본성상 악하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도[곧 인간이 본성상 악하지 않을 수도, 나아가 최초의 인간이 달리 행할 수도] 있었다고 표상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자연적 존재Naturwesen로 존재하고 스스로에게 그런 태도를 취하는 한, 이는 금해야 할 태도[곧 자기관계]이다ein Verhältnis das nicht sein soll. 정신은 자유로워야 하며, 정신 자체das, was er ist는 자기 자신을 통해 존재해야 한다[실체에 관한 전통적 규정(per se)을 지시한다]. 자연은 인간에게 단지 변형시켜야 할 출발점일 뿐이다. 원죄에 대한 교회의 깊은 가르침은, 인간이 본성상 선하며 따라서 이 자연-본성에 충실해야 한다는 현대[=헤겔 당대] 계몽사상의 가르침과 상반된다. 인간이 자연적 존재에서 벗어나 무대에 등장한다는 것은 인간이 외부세계로부터 자기의식적 존재인 자신을 구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의 입장은 정신의 개념에 들어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가 인간이 계속 머물러야 하는 장소는 아니다. 유한한 사고와 의지die Endlichkeit des Denkens und Wollens는 전부 이러한 분열의 입장에 속한다. 그러한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목적을 만들어 내며 자신에게서 행위의 재료를 얻는다. 인간이 이 목적을 궁극적인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보편을 배제하면서 특수성 속에서 자신만을 알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는 악하며, 이 악함이 바로 인간의 주관성이다. 얼핏 겉보기에는 우리가 이중적 악을 저지르는 듯 하지만, 사실 두 악은 동일하다. 인간이 정신인 한, 그는 자연적-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자연적 존재로서의 행태를 보이며 욕망의 목적을 따르는 한, 그는 이 자연적 존재가 되고자 의욕하는wollen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자연적 악은 동물의 자연적 존재와는 다르다. 더 구체적으로 자연성에는, 자연적 인간은 개별자 그 자체als solcher라는 규정이 속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연본성은 어떻든 [91] 개별화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성을 의욕하는 한, 그는 개별성을 의욕할 것이다. 그럴 때 충동과 경향성에 따르는 자연적인 개별적 행위에 맞서, 법칙 또는 보편적 규정이 등장한다. 이 법칙은 외적 폭력일 수도 신적 권위의 형태를 띨 수도 있다. 인간은 자연적인 행태에 머무는 한 [낯선] 법칙의 노예가 된다. 그런데 인간이 가진 성향과 감정 중에는 물론 이기적인 개별성을 넘어서는 동정심, 사랑 등과 같은 자비로운 사회적 성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이 직접적인 한, 그 성향은 즉자적으로 보편적인 내용을 지님에도 이 내용의 형식은 주관적[일 뿐]이다. 그것에는 이기심과 우연성이 항상 손을 뻗친다.
이상은 헤겔이 1830년 출간한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m Grundrisse (<철학적 학문들의 백과 강요綱要>, 이하 <철학백과>) 중 1부 논리학(Erster Teil : Die Wissenschaft der Logik)의 서론 격인 예비적 파악(Vorbegriff)의 24절에 관해 헤겔이 추가로 구두 설명한 것을 글로 옮긴 것(der mündliche Zusatz; 이하 "추가") 중 세 번째 부분이다. 나는 이를 위해 Suhrkamp 출판사에서 1970년 편집, 출간한 헤겔 전집 중 8권을 원전으로 삼았다. 위의 번역에서
1. 원어나 한자 병기가 필요한 경우 별도 표시 없이 우리말 뒤에 독일어나 한자를 달아 두었다.
2. "[ ]"는 역자가 추가한 것으로, 숫자만 들어 있는 괄호는 Suhrkamp판版의 쪽수를 표시한 것이고, 그 밖의 것은 맥락상 앞뒷말 사이에 생략된 것으로 보이는 말들이나, 선행하는 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넣어 두었다.
3. 다소 긴 설명이 필요한 경우들은 " * " 표시를 한 후 각주로 처리했다.
4. "( )"는 헤겔 본인의 표시이거나, 복합구/절로 이뤄진 문장을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해, 그리고 헤겔이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인용한 성경 구절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했다
5. 굵은 글씨 강조는 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헤겔 본인의 것이다.
* 번역어 “감각”의 원어인 “der Sinn”은 대개 ‘감각기관’ 또는 ‘감관’, 아니면 ‘의미’로 번역되지만, 여기서는 일단 대상 경험을 산출하는 수단과 연관된 맥락이라는 점에서 ‘의미’라고 번역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여기서 ‘Sinn’을 통해 신체적 오감(五感)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관이 마주한 사태의 본질 혹은 핵심을 알게 되는 것이므로 ‘Sinn’은 주관이 가진 ‘개념적이거나 논변적 사고를 거치지 않은 간파력’ 혹은 일상적 용어로는 ‘직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어지는 괴테에 관한 언급을 보라. 우리는 그와 같은 ‘간파력’ 혹은 ‘직관’을 가진 경우 통상 ‘감각이 좋다’라고 말하므로 나는 ‘감각’을 번역어로 사용했다.
** 통상 헤겔에서 ‘화해’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더 많다.
*** 이 문장의 강조표시는 역자의 것이다. 강조된 문구는 “in der Tat”의 번역이며, 이 낱말들의 조합은 관용적으로 ‘실제로’, ‘정말로’ 따위로 번역되고 헤겔 역시 자주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 하지만 그 문구에 들어 있는 ‘Tat’는 ‘행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tun’의 과거형 ‘tat’를 명사화한 것이다(이 ‘Tat’에 상응하는 영어는 ‘행한 일’, ‘사건’을 의미하는 ‘deed’이며 ‘실제로’, ‘정말로’라는 의미를 갖는 ‘in der Tat’에 대응하는 영어 표현도 ‘indeed’로, 영어의 이 표현 자체가 독일어에서 유래했다―https://www.etymonline.com 의 ‘indeed’항목 참조). 그리고 ‘Tat’는 ‘행한 일’, ‘실행된 일’, ‘행적’등의 뜻을 기본적 의미로 하며, 일상적으로 ‘범행’의 의미로도 빈번하게 쓰인다.
현재의 문맥에서는, 원죄가 인간의 우연적 행동이 지은 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한 후, 이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 곧 최초의 인간이 행한 일에는 정신의 개념이 담겨 있으며 그 개념에는 인간이 본성상 악하다는 것 함축되어 있다고 헤겔이 말하고 있으므로, 나는 일단 이점에서 해당 문구는 관용적 의미보다는“행한 일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를 “행한 일에서”라고 번역하게 되면 이 문구를 포함하는 문장은, 인간의 행위의 본성―위에서 나오듯 지금 문제가 되는 인간은 단지 아담과 이브라는 특정한 최초의 인간이 아니라 인간 일반이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된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문장은 행위의 두 요소인 의도와 실제 벌인 일 중 후자에 대한 언급이 된다. 종합하면 헤겔은 인간이 ‘의도를 실행한 결과는 본성상 악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다루는 인간의 앎과 악(곧 자연과의 분열)의 근원적 동일성에 대해서 또한 인간이 ‘행한 일’이 근원적으로 엮여 있음을 가리킨다. 곧 최초로 자연적 통일 상태와 분리될 때 인간은 이 통일을 해쳤다는 점에서 악이 되며 또한 그 분리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 악이 된다. 이 두 악은 근원적으로 같은 것이다. 이는 헤겔의 철학적 과제의 시작과 끝인 정신의 탄생과 정신의 실현이 같은 악의 문제로 관통됨을 의미한다.